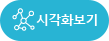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8200610 |
|---|---|
| 한자 | 鄭麟趾 |
| 영어공식명칭 | Jeong Inji |
| 이칭/별칭 | 백저(伯雎),학역재(學易齋),문성(文成)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,성씨·인물/전통 시대 인물 |
| 유형 | 인물/문무 관인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시대 | 조선/조선 전기 |
| 집필자 | 김우진 |
[정의]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의 효사정에 관한 시를 남긴 조선 전기 문신.
[개설]
정인지(鄭麟趾)[1396~1478]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한글의 창제 과정에 관여하였으며, 영의정 노한(盧閈)이 노량 나루터 부근에 복상(服喪) 후 축조한 효사정(孝思亭)에 관한 시문을 남겼다.
[가계]
정인지의 본관은 하동(河東)이며, 자는 백저(伯雎), 호는 학역재(學易齋), 시호는 문성(文成)이다. 증조부인 정익(鄭翊)과 조부 정을귀(鄭乙貴)의 관직은 확인되지 않는다. 아버지는 석성현감(石城縣監) 증영의정부사(贈領議政府事) 정흥인(鄭興仁)이며, 어머니는 흥덕 진씨(興德陳氏)로 중랑장(中郎將) 진천의(陳千義)의 딸이다.
[활동 사항]
태종이 직접 주재한 1414년(태종 14)의 식년문과(式年文科)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세종 대 집현전학사로 『훈민정음(訓民正音)』과 『용비어천가(龍飛御天歌)』 등의 창제에 참여하였다.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의 한강변 남쪽 언덕에는 세종 대 우의정에 오른 노한이 세운 효사정이란 정자가 있는데, 『신증동국여지승람(新增東國輿地勝覽)』 제10권의 경기 금천현(衿川縣)[현재의 동작구]에 정인지가 효사정에 대해 읊은 시구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.
“사정(思亭)이 높이 큰 강 위에 임했는데[思亭高杭大江頭], 효성스러운 아들 착한 손자 갖추어 아름답네[孝子慈孫自匹休]. 세덕(世德)은 이미 산같이 무겁고[世德已知山共重], 가성(家聲)은 길이 물과 함께 흐르네[家聲長與水同流]. 봄바람이 살랑거리는데 개오동나무 늙었고[春風搖漾松楸老], 가을날이 쌀쌀하니 골짜기가 그윽하다[秋日凄淸洞壑谷]. 굽어 보고 쳐다보는 정회를 누가 알아 주리[俯仰情懷誰識得]. 때때로 북궐(北闕)을 보니 서기(瑞氣) 띤 연기가 떴네[時看北門關瑞煙浮].”
노한이 모친을 위해 3년간 시묘(侍墓)한 부근에 세운 효사정은 정인지의 이 시문과 강희맹(姜希孟)의 「효사정기(孝思亭記)」 등을 통해 조선 시대 효도의 상징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.
[학문과 저술]
『훈민정음』과 『용비어천가』 등 한글 창제 및 관련 서적 편찬, 한글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. 1431년(세종 13) 조선 고유의 역(曆)인 『칠정산내편(七政算內篇)』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, 1442년(세종 24)에는 『사륜오집(絲綸要集)』, 1445년(세종 27)에는 『치평요람(治平要覽)』의 찬수(纂修)에 관여하였다. 사서(史書) 분야에서는 『고려사(高麗史)』, 『고려사절요(高麗史節要)』, 『태조실록(太祖實錄)』, 『세종실록(世宗實錄)』의 편찬, 개찬, 증수(增修) 및 감수에 참여하였다. 개인 문집으로는 『학역재집(學易齋集)』이 있다.
[묘소]
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에 묘소가 있으며 묘비에는 강희맹의 글자를 새겼다. 충청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다.
[상훈과 추모]
1453년(단종 1) 정난공신(靖難功臣) 2등에 책록되었으며 하동부원군(河東府院君)에 봉작되었다. 1466년(세조 12)에는 하동군(河東君)으로 작위가 개칭되었다. 1478년(성종 9) 사망 후 문성(文成)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.
- 『조선왕조실록(朝鮮王朝實錄)』
- 『신증동국여지승람(新增東國輿地勝覽)』
- 『국조방목(國朝榜目)』
- 『동작구지』 (서울특별시 동작구, 1994)
- 민족문화대백과사전: 정인지(鄭麟趾)